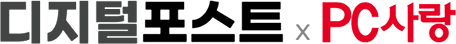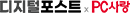결국 그 관계자 말대로 이뤄졌다. 셧다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안했었던 쿨링오프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표한 게임 중독법(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된다)까지 규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가부를 시작으로 문화부, 교과부, 보건부까지 올해 10조를 돌파한 국내 게임 산업을 자신의 산하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큰 규모와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90년대 넥슨의 바람의나라를 시작으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 다양한 국산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했다. 그 후 웹젠의 뮤, YD온라인(구 예당온라인)의 프리스톤테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T3의 오디션, CCR의 포트리스, 엠게임에서 서비스하는 후속작 라피스(구 네오다크세이버)의 전작인 다크세이버 등 다양한 게임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스타트는 리지니와 바람의나라가 끊었지만 나머지 게임들의 인기도 그에 못지않았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임사 중 아직까지 메이저게임사로 인정받고 있는 곳은 넥슨과 엔씨 소프트뿐이다.
이는 소모성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임의 특성 때문이다. 억대의 개발비를 들여 대작 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흥행하지 못하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만든 게임이라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콘텐츠 부족으로 게이머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또 다양한 게이머가 접속해 경쟁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버그에 대한 이슈도 문제다.
실제로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많은 게임들이 업데이트 미흡 또는 버그 문제로 하락세를 겪기도 했다. 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억대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 점도 문제다. 최근 몇 년간 발매된 수백억의 개발비가 든 대작 게임들 중 대박이라고 할 만한 게임이 없다는 점을 보면 게임업계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게임 개발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수많은 게임 회사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좋은 게임을 적합한 시기에 선보여야 하지만 개발 규모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서비스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기자도 매체에서 근무하기 전 게임 업계에서 일하면서 본 개발자들은 집으로 퇴근하는 모습보다 회사에서 숙식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OBT나 CBT 전과 같이 게임 개발 막바지에 다다르면 더욱 심해진다.
이런 생활은 서비스 시작 전 최종 검수를 하는 인원인 QA도 마찬가지다. 개발자와 함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근무하지만 국내 QA는 전문적인 QA인력을 육성하는 해외 개발사와 달리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정당한 대우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복지가 좋은 게임사들도 있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 게임사가 많은 게임 업계의 특성상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겠다는 꿈 때문에 힘든 조건 속에서도 게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개발자들의 노고와 게임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규모와 게임의 악영향만을 보고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인력, 수익 등 탄탄한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 게임 업계의 상황에서 계속되는 규제는 80년대 만화 산업과 같이 국내 게임 산업의 사장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사의 해외 이전에 논의에 대한 소식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게임 강국 한국이라는 명칭이 과거의 영광으로 남지 않으려면 게임 업계의 생리와 현실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면밀히 파악 후 문제점을 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ART PC사랑 임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