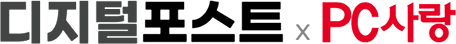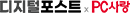저렴한 PC 스피커부터 비싼 AV 시스템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피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토종업체는 가뭄에 콩나 듯 적다. 그나마 2000년대 중반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국내 업체 몇 곳도 하나씩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렸지만, 브리츠 인터내셔널(이하 브리츠)은 스피커만을 고집해 국내파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브리츠, 해외 브랜드로 위장하다
1990년 중반, 우리나라 스피커 시장은 로지텍, 알렉텐싱, 야마하 등 세계적인 업체와 우리나라 이스턴전자가 경합을 벌였다. 작은 업체도 많아서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었다. 분위기를 타고 1997년 10월 웰컴이라는 회사가 브리츠라는 브랜드를 들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스피커는 물론 PC 주변기기에도 문외한이었던 창업자 이경재 대표를 스피커 사업가로 만든 건 무심코 구입한 스피커였다. 그는 소리를 내는 이 물건에 재미를 느꼈다. 소리가 나는 원리를 따지면 사운드카드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스피커가 훨씬 흥미로웠다. 이 대표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스피커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시장을 조사해보니 알렉텐싱, 로지텍, 야마하, 크리에이티브 등 세계적인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브리츠는 분위기를 따르기로 했다.
브리츠 마케팅팀 정재훈 이사는 “일부러 해외 브랜드인척 했다”고 운을 떼며, “당시 내로라하는 제품은 모두 해외 제품이었다. 영문일색의 상표 틈에서 국내 조그만 업체가 우리 이름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국산 분위기를 숨겼다. 때문에 지금도 브리츠가 국산 제품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명한 외국회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국내 브랜드로 밀고 나가지 않고 흐름에 살짝 올라탄 셈이다. 브리츠를 외국 회사로 생각한 건 오해가 아니라 철저한 의도였던 것이다.
이름에 얽힌 일화가 더 있다. 브리츠의 철자는 ‘Blitz’다. 중간에 ‘r’ 대신 ‘l’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로고를 꾸미다가 ‘l’로는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며 ‘r’로 바꾸었다.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단어는 사라졌지만, 해외 브랜드로 위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바다이야기 덕에 판매량 급증
브리츠 이름을 세상에 알린 건 두 번째 모델인 ‘BR-707’이다. 2.1채널 스피커인 BR-707은 독특한 생김새로 인기를 끌었다. 1년 여 만에 10만 대를 판매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 하나의 효자 상품은 2003년에 만든 ‘BR-1100’이다. BR-1100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덕을 톡톡히 봤다. 바다이야기는 카지노의 슬롯머신 같은 도박기계로 2000년도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다가 2006년 대대적인 단속에 수그러들었다. 카지노는 아니지만 소리만이라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런 요구에 브리츠의 제품이 잘 맞아떨어져 BR-1100은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바다이야기 생산시설이 있던 대전의 대리점은 순식간에 물건이 동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바다이야기 오락기가 퍼질 때 마치 세트처럼 함께 팔렸다. 정재훈 이사는 “아직도 대전이나 포천 쪽 게임관련업체에서는 이 제품을 찾을 정도”라며 당시 열풍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반면 AV 시장을 겨냥한 제품은 브리츠와 소비자에 모두에게 큰 아쉬움만 남겼다.
“2002년쯤 PC를 거실로 내놓고, TV 몸집도 커지면서 홈시어터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PC용 스피커 전문 브랜드 이미지도 벗고 다른 분야로 영역을 넓히려고 야심차게 준비해 2007년 AV-5800XD 톨보이를 내놨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홍보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1년 만에 철수했다.”
두 번째 아픔을 남긴 것 역시 AV 시장에 도전한 AV-2000S다. 출고가가 50만 원이 넘는 비싼 제품이고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였다. 정재훈 이사는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AV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잘 몰라서 실패했으니 계속 공부하고, 당당하게 입성하겠다는 욕심도 생긴다. 브리츠가 PC 스피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AV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가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PC 스피커 전문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가 아닐까. 은연중에 ‘PC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홈시어터 스피커를 잘 만들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영원히 스피커 외길 고집
브리츠는 PC 스피커로 첫 단추를 채운데다가, 다른 분야 제품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PC 스피커 전문제조사라는 인상은 점점 굳어졌다.
“이미지를 바꾸려고 가격대별로 차별화해서 브랜드를 달리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거래업체도 우리가 실패한 AV 제품이 만약 다른 이름으로 나왔다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말을 많이 했다.”
브리츠는 저렴한 제품에 강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AV 시장 진입이 힘들다는 건, 스피커는 브랜드의 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맛보다 뚝배기를 강조하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것도 브리츠의 숙제다. 설상가상으로 PC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헤드셋이나 모니터 일체형 제품으로 스피커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일체형 스피커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좁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스피커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분야에 눈 돌리지 않고 스피커에만 주력할 것이다. 대신 모니터 일체형이나 스마트폰 등장으로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으니, 흐름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줄 생각이다. 검은색에 네모반듯한 스피커 일색에서 벗어나 투웨즈 같이 빨간색 사과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이용자 입맛에 맞추려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 생각이다.”
에피소드 1 제품 이름에 숨겨진 비밀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옴다즈’ ‘로제타’ ‘포헨즈’등 브리츠는 독특한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대부분은 이경재 대표가 책이나 영화에서 따온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로 모범생이면서 귀여운 것이 제품과 닮았다며 붙여진 것, 빨간 사과 모양의 투웨즈와 공모양의 옴다즈는 ‘귀엽고 깜찍하다’는 뜻을 지닌 몽골어 한 단어를 2개로 나누어 지은 것이다. 스피커라고 꼭 소리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생김새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인다. 어울리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번호를 붙인다.
에피소드2 출력 뻥튀기(?)로 곤욕 
BR-4900T2
브리츠는 한 때 과한 출력 뻥튀기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스피커 출력은 정확한 측정 기준이 없지만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게 출력을 표시해 문제가 된 것이다. 소비자의 질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후 브리츠를 비롯한 스피커 제조사들은 출력 표기를 실제보다 낮춰 표기하기도 했다.
최근 한 소비자는 2W로 표기된 투웨즈를 스피커를 들어보고 “출력이 2W 이상은 된다며 너무 안정적으로 표기했다”는 의견을 올리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자의 말
새로운 방향의 브랜드 차별화 계획이 필요한 시점
국내 스피커가 취약한 부분은 유닛 개발 기술이다. PC 스피커는 일부 고가 제품을 제외하고 저렴한 유닛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국내외 제품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다. PC 스피커를 주력상품으로 내놓은 브리츠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싼 외국 제품과 견줘 음질 차이는 크지 않고 값은 더 저렴하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단 저렴한 보급형 스피커 제조사라는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브리츠는 다양한 변신과 빠른 제품 출시로 일반 이용자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급 브랜드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새로운 방향의 브랜드 차별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리츠 13년사


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